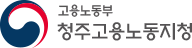정책·연구자료실 상세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II):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 분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주무부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14
-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주제별
형사정책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14-01-01
- 조회2
본 연구 사업은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연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우선 1단계(2012년)는 성범죄자 다면평가도구 및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연구로 성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을 평가하는 도구 및 범죄유발요인을 개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치료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단계(2013년)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연구로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해 보는 연구이다. 3단계(2014년도 예정)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로 개별 성범죄자가 정규 치료 종료 후 출소 시점까지 치료적 효과 유지를 위한 추가 치료를 받는 방안과 출소 시점에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은 성범죄자들의 사회내 치료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예정되어 있다.
2단계에 해당하는 올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는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연구 설계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동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One Group Pre-Post design)을 사용하여 치료프로그램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변화량을 효과성 판단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사후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평가척도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전국 7개의 집중 교도소와 2개의 심화 교도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총 109명의 성범죄자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전년도부터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로 성범죄자 다면평가 도구(K-MIDSA)의 1차년도 타당화 작업에 대한 보완이다. 성범죄자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자의 범죄유발요인을 평가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 목표를 세우는 작업이 이뤄져야한다. 전년도에 K-MIDSA의 일차적 타당화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전년도에 이어 올해는 K-MIDSA의 타당화 작업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 K-MIDSA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성범죄자 391명과 일반인 370으로 샘플을 구성하여 척도별로 집단간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가. 교정시설내 치료프로그램의 집단적 수준에서의 효과성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치료내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먼저 치료내 변화량의 첫 번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치료전과 치료후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사전·사후 평가척도 13개 중 7개의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집단 수준의 치료내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인 척도는 강간통념척도, 분노억제척도, 충동성척도, 아동성폭행척도, 외로움척도, 자아존중감척도, 그리고 주관적 안녕척도였다. 이 중 치료내 변화량이 가장 큰 척도는 강간통념척도와 아동성폭행척도로 부분에타제곱의 크기가 각각 .258, .244로 효과 크기 면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량을 보였다. 또한 외로움척도와 자아존중감척도도 각각 .127, .158의 큰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척도와 충동성 척도의 경우 효과 크기가 각각 .090, .073으로 중간정도 효과 크기에 해당하는 변화량을 보였으며 분노억제척도의 경우 .043으로 효과 크기는 적었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량을 보였다.
그러나, 치료내 변화량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는 척도들도 존재하였다. 특히 스트레스시 성을 이용하여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성을 이용한 대응척도’의 경우 치료내 변화량이 거의 없었다. 이 밖에 분노표출척도, 분노통제척도, 대인반응성척도, 여성적대감척도, 성적환상척도의 경우도 치료내 변화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원문확인>